
도라지꽃
정순이
포플러가 줄지어 서 있는 신작로 길을 타박타박 걸어 반 시간 남짓이면 아버지가 밭일하시는 언덕배기 위 갈가뫼기 우리 밭이 나타났다. 어머니가 싸준 아버지의 점심이 담긴 베 보자기는 제법 무거웠다. 저만치 소나무 아래 햇빛을 즐기던 꿩이 나의 발자국 소리에 푸드득 날아가는 소리에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와 소나무 그늘에 앉아 베 보자기의 점심을 풀었다. 반짝이는 스텐 밥그릇에서 고봉으로 담긴 하얀 쌀밥을나의 몫으로 들어 주시고, 불그스레한 양념에 감자를 넣고 졸인 갈치의 두툼한 부분을 내 밥 위에 올려 주셨다.
추수 후 양곡 수매를 하고 나면 제법 현금을 만질 수 있었지만, 조합의 이런저런 농자재 대금과 빌린 영농자금을 갚고 나면 한해의 농사로 마련한 돈은 거의 바닥이 나버렸다. 많은 식솔에 소규모의 농사를 지었던 우리집 형편은 늘 아껴야만 하였다. 아버지와 막내에게는 쌀밥이 돌아갔고 우리는 거의 보리밥을 먹어야 했다. 입안에서 뱅뱅 돌던 보리밥이 먹기 싫었던 나는 쌀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아버지의 점심 배달하기를 좋아하였다. 학년이 올라가고 머리가 커지자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뽀얀 먼지가 연기처럼 시야를 가로막는 신작로 길을 한참이나 걸어가야 하는 아버지 점심 배달을 하는 게 싫어졌다. 인근의 큰도시로 중학교를 다니게 됨으로써 자연히 점심 배달은 내 아래 여동생의 몫이 되었다.
없는 살림이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밭농사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8남매의 뒤치다꺼리 하느랴 어머니는 집안일로 늘 바쁘기도 하였다. 아버지는 나들이 가실 때는 한복 입으시기를 좋아하셔서 아버지의 한복 손질하기에도 바쁘셨다, 어머니는 우리 8남매의 옷도 직접 재봉틀로 만드셨다. 어머니는 재봉 솜씨가 좋아 가늘게 바이어스를 덧대어 솔기를 마무리하셨고,자투리천을 이용하여 곰이나 토끼 등 귀여운 동물 캐릭터 아프리케도 만들어 달아 주셨다. 음식 만들기도 좋아하여 명절이면 늘 강엿을 고아 한과를 만드셨다. 명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여 나는 왜 힘들게 집에서 만드느냐고 툴툴거렸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 가장 그리운 게 어머니의 명절 음식이었다.
중학교 1학년 여름 방학이 시작될 무렵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위로 언니 셋만 시집 보낸 어머니는 갑자기 생계를 짊어지는 가장이 되셨다. 큰 오빠는 군대에 가 계셨고, 대학생인 작은 오빠. 그 아래 나를 포함한 딸 셋은 아직 제 앞가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무래기들이었다. 그동안 농사일을 하지 않았던 어머니이지만 당장 논으로 밭으로 나가셔야 했다. 논농사는 바쁜 모내기철만 지나면 일꾼을 사서 할 수 있었지만, 밭농사는 남의 손을 빌리기에 애매하게 자잘한 일들이 많았다. 군청 소재지의 우리집에서 오리 밖의 거리에 우리 밭이 있었다.
아버지의 무덤은 바로 우리 밭 양지바른 넉넉한 자리에 모셨다. 봄이면 건너편 나즈막한 산에서 산비둘기. 뻐꾸기 울음소리가 간간이 들리고, 여름이면 둔덕 위 활짝 피었던 배롱나무의 붉은 꽃잎이 하롱하롱 떨어졌다. 저녁이면 서녁으로 비껴 간 석양아래 소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아버지의 무덤 옆에 어머니의 자리도 미리 마련해 두셨다.
어머니는 밭농사철이 되면 그 먼 거리를 아침저녁 두 번이나 밭일을 가셨다. 아버지 돌아가신 외로움을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밭에서 일을 하며 달래었을까? 하얀 참깨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엎드린 어머니의 머리수건 위로 춤을 추었다. 가을 햇볕에 어머니는 참깨를 털면서 벌써 고소한 냄새가 번진다고 하셨다. 커다란 방수포 비닐 위에 널어놓은 콩대의 콩꼬투리가 두터운 햇볕에 탁탁 터지는 소리도 어머니에게는 정겨운 노래처럼 들렸을 것이다.
해가 저물어 깻단을 머리에 이고 리어카로 옮길 때 혼자서 그 무거운 깻단을 올릴 수 없어 주저 앉았다가, 어머니는 "성모님 도와주세요."하고 기도를 하면, 정말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겁던 그 깻단이 덜렁 머리 위로 올라가더라고 하셨다. 자잘한 자갈돌이 깔린 그 울퉁불퉁한 길 위로 리어카를 끌고 돌아오는 길은 어서 집으로 가서 자식들 굶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늘 허둥댔을 것이다.
햇빛 좋은 우리집 채마밭에는 늘 푸성귀가 푸릇푸릇하였고, 단감나무. 대추나무, 가죽나무 등이 담장처럼 빙 둘러 서 있었다. 반질반질한 검은 방구들 돌로 편편하게 마무리한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장독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꽃을 좋아하셨던 어머니는 늘 봉숭아, 채송화, 맨드라미, 과꽃 등 철을 따라 심었다. 어머니는 특히 봄을 알리는 함박꽃과 늦가을에 피는 소국을 좋아하셨다. 모란처럼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함박꽃을 보면 늘 어머니 생각이 난다. 서리내려 시들어가는 국화를 보면 어머니를 보는 듯 애잔한 마음이 든다.
우리 모두 출가를 시킨 후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외로움을 달래셨다. 어머니는 가톨릭 농민회에 가입하셨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신을 염을 하는 것을 배우셨다. 어느 행려병자의 시신을 깨끗하게 염하여 하늘로 보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내가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시면서 담담히 웃으시던 어머니.
도움이 필요하면 늘 먼저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막상 내 살기에 바빠 어머니를 챙겨드리지 못하였다. 혼자서 제대로 식사를 챙겨 드시지 않은 어머니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입원하셨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 한 달 만에 저세상으로 떠나셨다.
어머니의 부음을 들은 날은 초여름 더위가 맹렬하였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이었지만, 치렁치렁 기다란 상복을 입고 누런 삼베 수건을 쓰고 집에서 삼일장을 치루었다. 매일 아침마다 미사에 가셨던 우리 집 뒤의 성당에서 많은 교우들의 눈물과 기도 속에서 긴 장례미사를 드린 후 아버지가 누워계신 우리 밭으로 상여를 매고 언덕길을 올랐다. 아픈 몸으로 언제 어머니가 가꾸셨을까? 비탈길에 미끌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언덕을 오르는 내 눈에 저만치 하얀, 보라색 도라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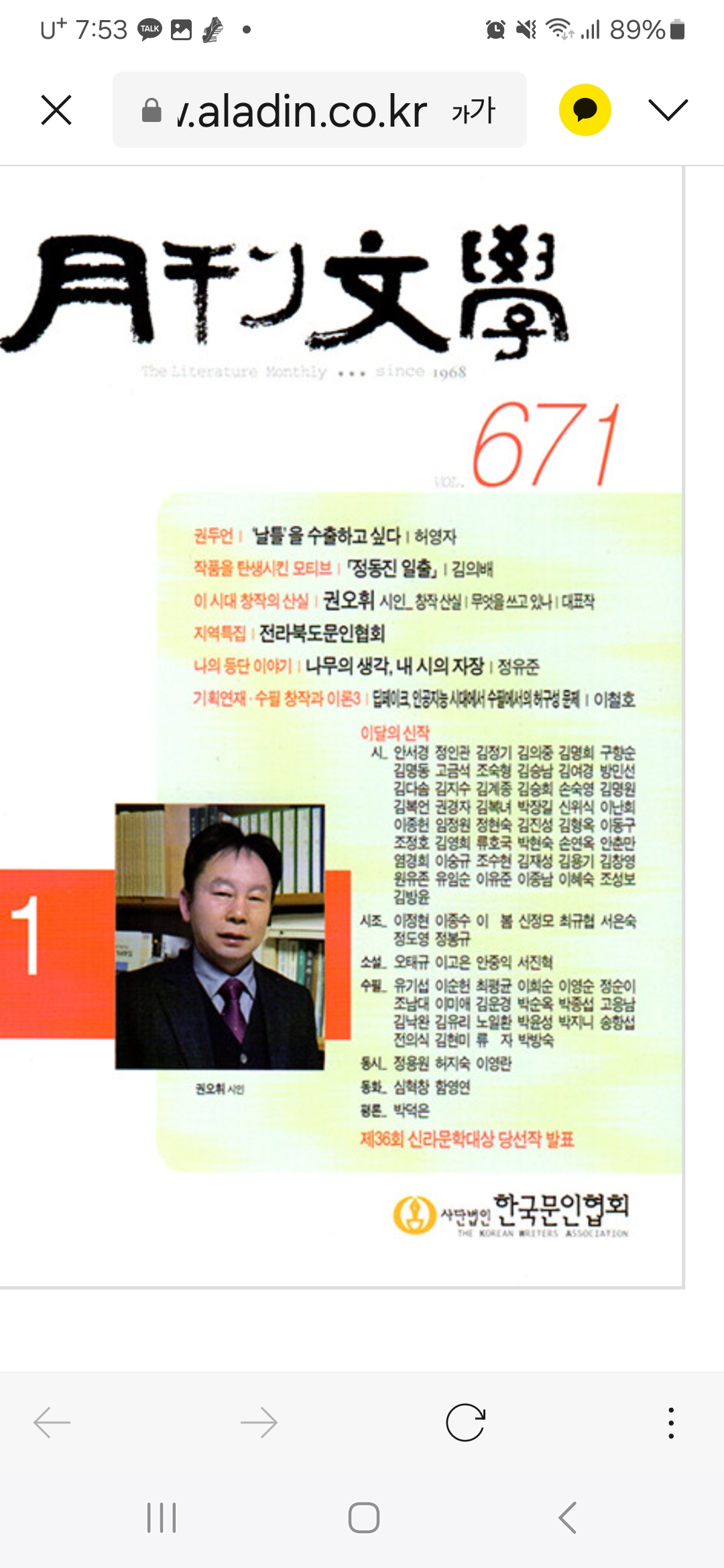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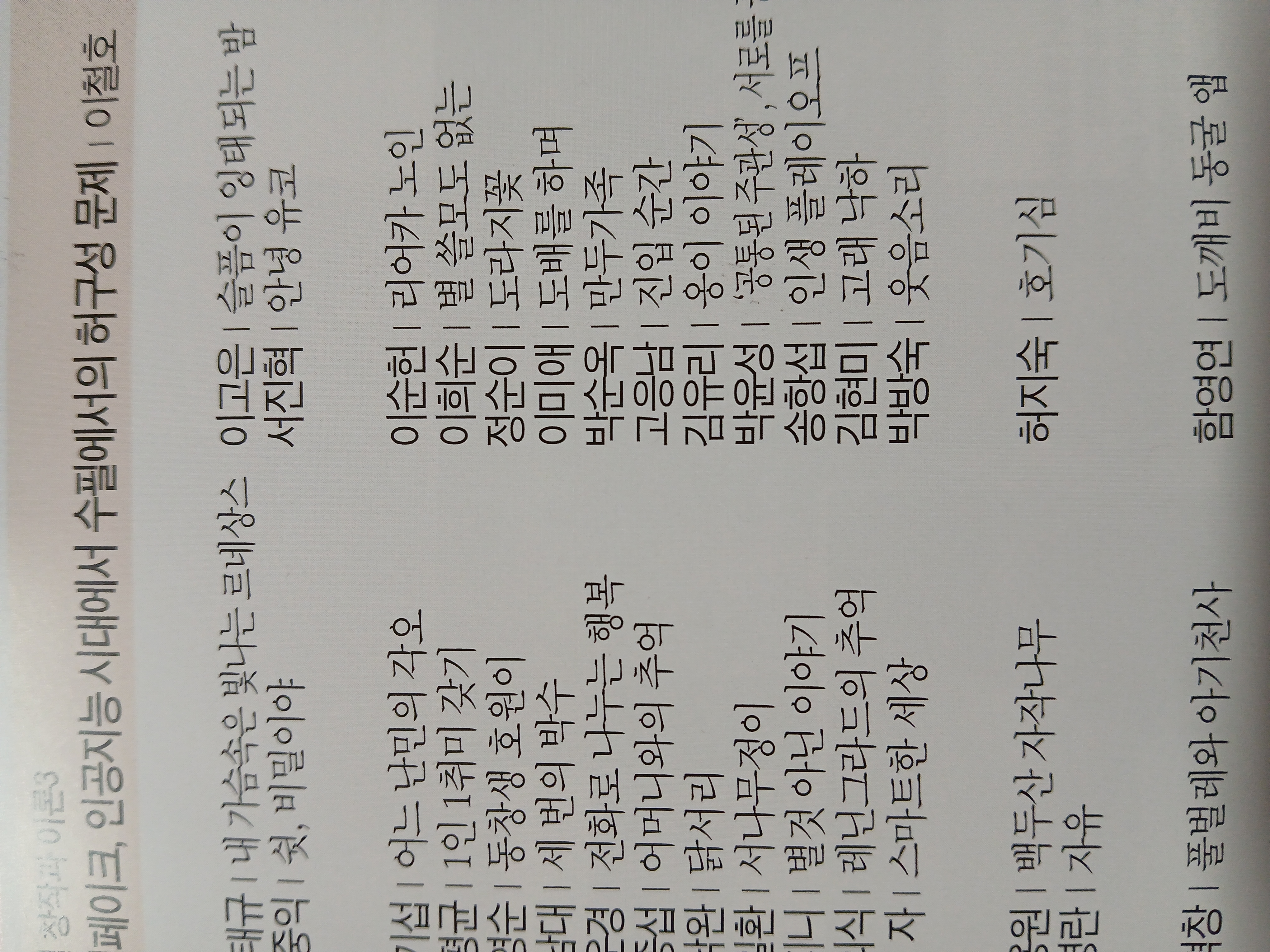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뚝섬한강공원의 눈사람 (1) | 2025.01.05 |
|---|---|
| 나는 부끄럽다 (0) | 2025.01.05 |
| 한 해를 보내는 밤에 (0) | 2024.12.31 |
| 아들 집의 성탄절 (며느리가 보내준 사진) (0) | 2024.12.25 |
| 대림절 (0) | 2024.12.22 |